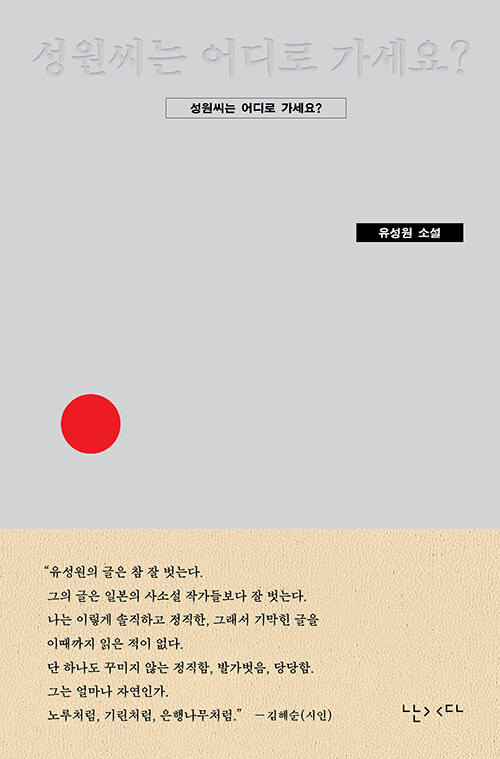
『성원씨는 어디로 가세요?』
유성원 지음, 난다 펴냄
그러고도 남는 질문
어떤 물음표에는 호기심이 가득 담겨 있다. 가령 “그 안에 든 게 뭐예요?”나 “우리 뭐 먹으러 가요?” 같은 질문에 담긴 물음표. 얼굴 전체를 궁금함으로 주름지게 만드는 물음표. 의심을 품고 있는 물음표도 있다. “그게 진짜 맞는 거예요?”나 “네가 어제 보냈단 말이지?” 같은 질문에 담긴 물음표. 그러지도 않을 수 있(다고 믿)기에 얼마간의 긴장감을 동반하는 물음표. 물음표 다음에 깃드는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이다. 무엇의 정체에 대해 알려 주기를, 반문한 것에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물음표는 기다림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가 다름 아닌 기대감임을 보여 준다.
한편, 어떤 물음표는 문장 부호라기보다 구두점에 가깝다. 구두점은 쉼표와 마침표를 가리키는데, 구두점에 가까운 물음표는 굳이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다. “가는 거죠?”라는 물음에는 상대가 갈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다. “날씨가 좋죠?”라는 물음은 의례적인 인사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답정너’의 상황은 비단 일대일의 관계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일대다의 상황, 사회가 개인에게 암암리에 요구하는 방식에 지나치리만큼 치밀하게 스며들어 있다. “성원씨는 어디로 가세요?”가 바로 그런 질문이다. “우리는 갈 데가 있는데 당연히 당신도 갈 데가 있겠지요?”라는 말을 돌려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어서 가세요. 우리끼리만 할 일이 있어요.”라고 적극적인 거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 물음표가 날아들었을 때, 상대는 보통 묵묵부답할 수밖에 없다. 악의 없음의 악의가 이렇게나 무섭다. ‘답정너’가 ‘입틀막’이 되는 것이 이렇게나 쉽고 간편하다. 볼일이 마무리되었음을 직간접적으로 알릴 때,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다. 문장의 끝을 올리며 물을 때조차 볼 장은 이미 다 보았음이 선명해진다. 그럴 때 선명해지는 것은 내가 속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속하지 못했다는 데서 오는 복합적인 감정이다. 그들을 미워하는 데 쓸 수도 있을 힘을 그는 자신을 들여다보는 데 쓴다. 그의 말마따나 이는 ‘노력’일 것이다. 그래서 이 소설은 드라마처럼 슬프고 다큐멘터리처럼 생생하다. 활활 타올라서 눈에 보이는 슬픔도 있지만, 어떤 슬픔은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그 속에 잠겨야만 겨우 느낄 수 있다.
김혜순 시인의 추천사는 이렇게 시작한다. “유성원의 글은 참 잘 벗는다. 그의 글은 일본의 사소설 작가들보다 잘 벗는다. 내가 벗는다고 할 때의 이 벗음은 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그의 글이 그렇다는 거다. 그의 글은 벗은 다음 또 벗는다.” 벗는 글은 벗은 글과는 다르다. 거기에는 가식과 굴레를 벗어던지겠다는, 맨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헐벗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묻고 또 묻고 의심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깊이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다. 한 사람을 설명하는 다양한 ‘칭호’를 자신이 직접 찾아 헤매겠다는 것이다. 얼마나 외롭겠는가. 얼마나 막막하겠는가. 또 얼마나 기쁘겠는가. 옷을 벗어야만 내 알몸을 볼 수 있듯, 허울을 벗어야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성소수자로서, 크루징(cruising, 길거리나 화장실, 극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를 돌아다니며 데이트 상대를 찾는 일) 문화의 일원으로서,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남성을 뜻하는 ‘MSM(Men Who have Sex with Men)’으로서, HIV 감염인 혐오에 정면으로 맞서는 활동가로서,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들여다본다. “벗은 다음 또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뾰족하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소설에 등장하는 ‘성원씨’를 보자. 작가와 이름이 같다고 해서 ‘이 성원’이 ‘그 성원’이랑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소설이라는 형식이 ‘이 성원’과 ‘그 성원’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성원씨는 어디로 가세요?』는 ‘이 성원’과 ‘그 성원’ 사이를 부단히 오가며, 우리에게 시종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당신의 심장은 어디를 향해 뛰고 있나요?”
소설 속 성원씨는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일을 좋아할 수 있지만 일을 좋아하는 나 때문에 내가 싫어질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을 이해한다.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이 마냥 기쁘다거나 행복하다는 건 아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행복으로 노력한다. 이것은 정말로 노력이다. 사랑하는 일, 노력.”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가능성이다.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때로 휩쓸리거나 이끌려 갈 수밖에 없더라도 그것이 나의 결정이었음을 재확인하기, 상황에 깃드는 일이 ‘노력’이 필요한 것임을 겸허하게 깨닫기, 있는 그대로의 나를 긍정하기, 나를 알기 위해 힘입듯 벗기. 규정과 낙인, 배제와 소외를 오가며 이 필요함은 절실함이 된다. 그리하여 우리가 도착하는 곳은, 사람은 유성원일까. 우리는 고작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소설을 써 주셔서)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농담처럼 건네는 진심이다. 그러고도 남는 질문은 이것이다. 부드러운 배제가 아닌, 생동하는 호기심으로.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성원씨는 어디로 가세요?” 그의 다음 소설은 이미 쓰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글쓴이 오은
이따금 쓰지만 항상 쓴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살지만 이따금 살아 있다고 느낍니다. 시집 『없음의 대명사』 등, 산문집 『뭐 어때』 등을 썼습니다.

